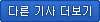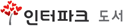지난 7월 중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조정래 표절’이라는 말이 인기검색어로 올랐다. 조정래 작가가 표절을 했다는 말이 아니다. 당시 한국 문단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표절에 대한 논란이 뜨겁던 가운데, 조정래 작가가 그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도서 북DB는 7월 14일 인터뷰 기사를 통해 조정래 작가의 발언을 전했고, 이후 여러 언론이 이를 인용했다. 대다수의 작가들이 말을 아끼고 있던 상황, 원로작가의 쓴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밖에도 많은 작가들이 2015년 한 해 동안 인터파크도서 북DB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이어령 작가는 ‘갑’과 ‘을’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꼬집었고, 신영복 작가는 독자와 작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짚어줬다. 그리고 김난도 작가는 청년에게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의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한 해 동안 인터파크도서 북DB가 만난 250여 명의 작가들 가운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열 명이 남긴 ‘촌철살인’의 한마디들을 모았다.
[조정래] “표절은 자살행위이며 타살행위... 독자의 영혼 죽인 것”
“모든 예술가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도 자기의 능력이 부치면 그만 물러가는 게 정도예요. 운동선수만 은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술가도 ‘아 도저히 능력이 안 되겠다’ 그러면 깨끗이 돌아서야죠. (줄임) 표절은 자살행위이면서 타살행위예요. (줄임) 타살행위라는 것은, 그의 작품이 새롭다고 믿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를 구하고 신뢰를 가지고 읽어준 독자들의 영혼을 죽인 거라고요.”
▶“문학은 ‘길 없는 길’... 치열성 없이 작가 못해”(7. 14. 최규화 기자)
[이어령] “지금 한국 사회에는 주먹-보자기, 갑-을밖에 없다”
“이제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인류 문명 스타일이 문제인 거예요. (줄임) 온 인류의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아시아 사람이 줘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서양의 썩은 동아줄 쥐다가 함께 떨어져 죽는 길밖에 없어요. (줄임) 지금 한국사회엔 주먹 보자기, 갑을밖엔 없어요. 이런 국면에 주먹이 절대 패자가 아니고, 보자기가 절대 승자가 아닌 서로 고루고루 맞물려서 돌아가는 순환적 평등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 이어령이 말하는 아시아 문화의 열쇠는 ‘가위바위보’(8. 31. 주혜진 기자) )
[신영복]멘토에 갇히면 안 되고 다시 뛰어넘어야 한다”
“고전은 읽어야죠. 고전이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책은 멀리서 찾아온 벗입니다’라는 말도 써놓았어요. 멘토에 갇히면 안 되고 다시 뛰어넘어야 해요. 책에도 썼지만, 저자는 끊임없이 죽고 독자는 부단히 탄생해요. 그런 방식으로 독자와 저자가 만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독자들은 저자에게 불손해도 돼요.”
▶ 신영복 “관계에서 답을 찾아라”(4. 27. 김영은 기자))
[김난도] “공정한 사회와 자기성장 노력은 자전거의 두 바퀴”
“사회 구성원이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하나는 사회 구조적 모순과 제도를 바꿔서, 개인들이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에 상응하는 효과를 누리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건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 같은 거예요. (줄임) 기성세대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기 전에,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 웅크린 시간을 독하게 앓고 있을 당신과 함께, 김난도의 세대담론(11. 20. 임인영 기자))
[김윤식] “독자들 문학 안 읽지만, 문학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누가 문학 읽어요? 당연히 안 읽어요. 지금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정보가 없을 땐 문학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망하느냐?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안 망하느냐? 헤밍웨이 말대로 ‘받아쓰기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받아쓰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직접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줄임) 자기가 직접 써야 하는 건 남는 거니까. 그래서 문학이 망하지 않아요.”
▶ 문학평론가 김윤식 “작가는 쓰고, 비평가는 읽는다. 그 외엔 아무 것도 없다”(11. 13. 주혜진 기자))
[정현종] “자기 삶 끌어올리고 싶은 욕망, 그게 사람다운 삶”
“생존 차원에 우리 삶이 머물러서는 인간의 삶이 값어치가 있을까? (줄임) 먹고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직업을 갖고 돈벌이를 했으니까,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건 기본이지. 먹고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심각한 거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런 다음부터는 좀 더 높은 쪽으로 자기의 삶을 끌어올리고 의미 있게 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게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요?”
▶ ‘등단 50년’ 정현종의 사유로 읽은 20세기 위대한 시인들(9. 14. 이미회 기자))
[황석영] “한국 젊은 소설가들, ‘송곳’의 당대 문제에 접근해야”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줄임) 그거 다 만화 아니에요? 문학이 그런 서사를 다 놓치고 있다니! 그 현실 접근 방식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 젊은 소설가들이 바로 이런 당대의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드라마들이 현실에 강력하게 접근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보면서, 한국문학의 위기는 한국문학 스스로가 현실에서 멀어지면서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황석영 “드라마 ‘송곳’ 보며 감동... 원로작가로서 자괴감도”(11. 27. 최규화 기자))
[김홍신] “미친듯 사랑한 추억 하나 없다면 영혼을 어디에 의지할까”
“요즘 젊은이들 사랑은 가볍고 계산적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줄임) 그걸 우리 시대가 옳고 지금 시대가 그르다는 것으로 보지 말고 다르다는 관점으로 봐야 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애절한 사랑을 해서 죽을 때라도 품고 갈 수 있으면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미친 듯이 사랑한 추억 하나 없다면 늙어서 내 정신과 영혼을 어디에다 의지할까요? (줄임)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 김홍신 “이 나이에 무슨 사랑 이야기냐고요?”(5. 22. 이미회 기자))
[강준만] “정치는 사람의 문제 아냐... 게임의 룰에 문제 있는 것”
“‘너 많이 해쳐먹었잖아. 그럼 다른 놈도 해먹어야지.’ (줄임) 마치 조폭들이 돌려가면서 나눠 먹는 정의에 가까운 거죠. 그 심리에요. 정치권에 대한 혐오, 저주. 그래서 조폭처럼 쓸고, 치고 청산해야 시원한 거. 물갈이 한다는 거죠. (줄임)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사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괜찮은 분들 국회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되면 뭔가 게임의 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임이죠.”
▶ 당대에 룰을 바꾼 남자, 강준만을 만나다(7. 2. 김창규 기자))
[김진명] “정치권 의식 수준 낮아서 귀 안 열고 있다”
“작가는 끊임없이 현실비판을 하는 존재인데, 우리 작가들의 현실비판은 그동안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 의식으로만 주로 국한돼 있었어요. 하지만 (줄임) 웬만한 은유나 비유로는 꿈쩍 안 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개인의 삶을 흔드는 건 정치나 경제 등 굵직굵직한 이데올로기인데, 작가들이 이에 대해 전혀 못 쓰고 있는 건 대단히 큰 문제죠. 정치권의 의식이 워낙 낮아서 권력이 들어야 하는 소리에 귀를 안 열고 있어요.”
▶ <글자전쟁> 김진명 “작품에 남북관계 방향 담았다”(8. 21. 주혜진 기자)